It is the function of science to discover the existence of a general reign of order in nature and to find the causes governing this order. And this refers in equal measure to the relations of man – social and political – and to the entire universe as a whole. — Dmitri Mendeleev
과학의 역할은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 근본 원인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사이의 정치/사회적 관계 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대해서도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다. — 드미트리 멘델레예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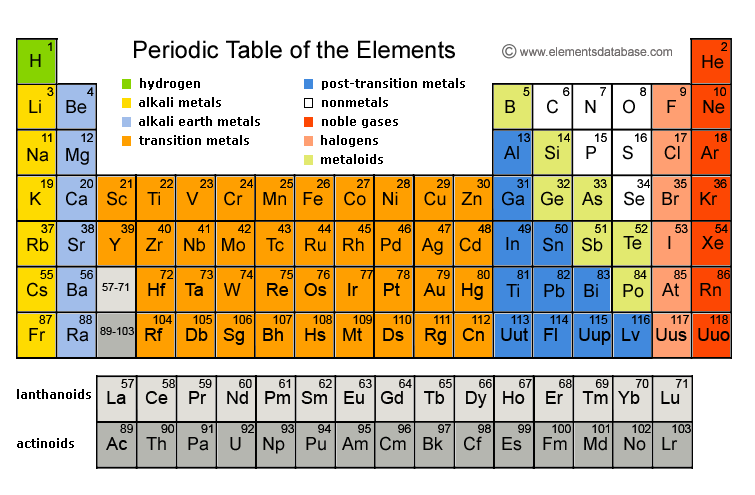
주기율표의 발견은 화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일이었다. 멘델레예프도 초기 주기율표를 제작했던 사람 중의 한 명으로 지금은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다른 과학자들보다 멘델레예프가 대담했던 점은, 원소들 간에 주기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그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는 그 주기성을 바탕으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특성까지 예측하기에 이른다.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던 게르마늄의 성질을 예측하고, 그 예측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주기율표가 나오기 전에는 모든 원소들의 화학적 특성이 따로따로 연구되었던 것이, 주기율표의 등장 이후에 드디어 원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질서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다. 주기율의 발견이 고철을 금으로 바꾸려고 했던 연금술의 시대가 끝나고 현대 화학으로 넘어온 갈림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주기율표는 화학의 기본 단위라고도 할 수 있는 원소를 원자량 오름차순으로 나열한 표다. 복잡한 세상이 100개도 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내가 처음 주기율표를 접했을 때 꽤나 흥미로운 아이디어였다. 100개만 다 외우면 세상을 다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아무튼 세상에 잘 알려진 92번 우라늄이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원소다. 자연 상태에서 오랫동안 존재하는 원소만 모아놨으면 주기율표에 들어 있는 원소의 개수는 100개 미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호기심이 더 무거운 원소를 합성해 나가게 했다. 여기서 합성은 냄비에 넣고 끓이는 연금술 같은 합성이 아니라 원자 상태의 원소를 입자가속기에 넣고 엄청난 속도로 돌리면서 충돌시켜서 쪼개져 나오는 입자 중에 새로운 원소가 있는지 찾아내는 방식이다. 그래서 꼭 번호 순서대로 발견된 것은 아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세기 중반에 대량으로 초중량 원소들이 발견된다. 원소를 새로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이름을 붙여야겠는데, 신이 난 과학자들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듯이 재미있는 이름들을 붙이기 시작한다. 87번 프랑슘 (Francium), 95번 아메리슘 (Americium)은 나라와 대륙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98번 원소는 미국의 한 주의 이름을 따서 캘리포늄 (Californium)으로 명명되었다. 심지어 학교가 있는 도시이름을 딴 97번 버클륨 (Berkelium)도 있다. 이는 당시에 2차 대전 중에 로렌스 연구소가 UC 버클리에 있었고, 그 연구소 주변에 입자 가속기 등 첨단 장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듯 하다. 지금도 버클리 캠퍼스에는 플루토늄을 처음 발견한 연구실이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발견한 동네 이름을 붙인 사례는 20년 가량 뒤에도 두세번 정도 더 등장하게 된다.
지명을 붙이는 것은 조금 유치하게 보였는지 과거 과학자의 이름을 따라 붙인 원소명도 상당수가 있다. 96번은 퀴리 부인의 이름을 따라 퀴륨 (Curium), 99번은 아인슈타이늄 (Einsteinium)이다. 그 뒤에도 페르미, 멘델레예프, 노벨, 로렌스, 러더포드, 시보그, 보어 등 쟁쟁한 학자들의 이름을 따서 원소 이름을 지어놨다. 현재는 이렇게 낭만적인 이름이 붙은 원소는 111번까지다. 111번 뢴트게늄 (Roentgenium)을 마지막으로 112번부터는 딱딱한 이름이 붙어 있다. 112번 이후의 명명은 원자번호를 라틴어 방식으로 표현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112는 Ununbium, 113은 Ununtrium, 118은 Ununoctium과 같이 말이다. 확실히 발견되면 정식으로 이름을 붙여준단다. 이 중에서 118번 원소는 기체 상태이면서 반도체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한다. 나중에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기체 반도체와 같이 흥미로운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
자연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사람 고유의 욕망일지 모르겠다. 원소들에만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별자리 이름도 가만히 있는 별들에 이름을 붙여준 것 아닌가.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천문학도 하나가 새로운 별을 발견하고 그 별에 이름을 붙여서 연인에게 선물해 준다는 스토리가 떠오른다. 한편으로 유치하면서도 낭만적인 이야기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대상을 기억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름이 붙지 않은 모든 것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망각되어 버린다. 김춘수 시인의 “꽃”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